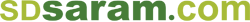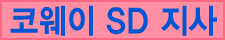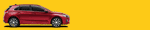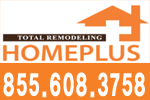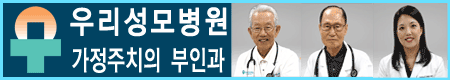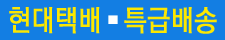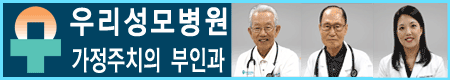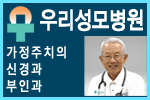1박2일 기차여행… 봄소풍 떠나요
1박2일 기차여행… 봄소풍 떠나요
샌타바바라 찍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중가주 명소 순례
바야흐로 봄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코끝을 자극하고 기지개를 켜니 잔뜩 움츠렸던 몸에 활기가 도는 게 느껴진다. 추위를 핑계 삼아 겨울 동안 집에서만 보냈지만 한 번쯤 콧바람을 쐬고 싶어지는 계절.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차여행이다.
최근 한인 여행사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 1박2일 기차여행은 바로 이럴 때 안성맞춤이다. 보통 기차여행의 일행은 약 10명으로, 예전 같으면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시작되지만 올해부터 기차 일정이 변경돼 샌타바바라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기차를 탄다. 예전 일정 같으면 샌타바바라는 기차를 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코스였지만 손님들은 샌타바바라를 볼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인 셈이다. 따뜻한 봄을 맞아 떠나는 1박2일 기차여행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봤다.
미션 관광 후 바닷가 김밥… 관람칸 창너머 절경 펼쳐져
기차여행은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직접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 여유롭고, 창밖의 풍경들을 구경하다 보면 절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 샌타바바라
자동차로 2시간 못 미쳐 달리니 LA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샌타바바라를 알리는 표지가 보였다. 미 서부 대륙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도시여서 샌타바바라는 길 이름은 물론 도시 구조가 스페인 가톨릭 식으로 구성됐다.
샌타바바라의 첫 번째 관광지는 단연 ‘미션’(Mission)이다. 초기 스페인 사람들은 해안을 따라 서부를 탐험하는 중간 중간 미션을 설립했다. 미션은 성당의 기능을 넘어서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고 원주민들에게는 유럽식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한다. 스페인 군인들은 모두 21개의 미션을 설립했는데 샌타바바라 미션은 그 중 10번째다. 샌타이네즈(Santa Ynes) 산맥을 배경으로 산 중턱에 설립된 샌타바바라 미션은 큰 규모 덕분에 ‘미션의 여왕’(Queen of the Mission)으로도 불린단다.
미션 구경을 끝내고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LA서 가져온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백사장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김밥의 맛이 나쁘지 않다. 잘 삶은 계란을 정성들여 싼 봉지에서 소금에 찍어 먹으니 소풍 나온 느낌이 더했다.
■기차 타고 샌루이스 오비스포로
샌루이스 오비스포를 향해 떠나는 기차는 외관부터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국 기차와 달리 2층으로 돼 있어 낭만이 느껴졌다. 구세군 자선냄비 사관 같은 복장을 한 열차 승무원이 티켓 숫자와 사람 숫자를 확인한 뒤 탑승을 허락했다.
1층은 화장실이나 짐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객실은 모두 2층에 있다. 큰 짐들은 모두 1층 수납공간에 두게 되어 있다. 객실에는 좌석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지정 좌석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많아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창가 쪽으로 이동해 않는다. 승무원이 다시 표 검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 더욱 정겨웠다.
좌석 사이의 공간이 꽤 넓지만 등받이는 뒤로 약간만 눕혀져 그리 편하지는 않았다. 기차의 이동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 승차감이 대체로 좋은 편이다.
특히 관람 전용 칸은 말 그래도 차창 밖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 창가 쪽으로는 좌석이 4개씩, 여러 개 배치돼 있어 탁 트인 창으로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관람 차의 절반은 좌석이 마주볼 수 있도록 테이블이 설치돼 있는데 음식을 구입해서 먹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열차 안은 상당히 춥다. 승객들 모두 추워 보이는데도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온다. 여분의 잠바나 가벼운 담요를 지참하는 게 좋을 듯싶다.
샌타바바라는 기차여행의 출발점이다. 기차에 오르기 전 시내를 둘러보는 것도 즐겁다. 한가로운 미션 모습.
바다코끼리·모로락·아빌라항 “구경 한번 잘했네”
■ 기차여행
■ 샌루이스 오비스포
3시간 정도 어둠을 뚫고 밤 8시20분 샌루이스 오비스포 기차역에 도착하자 먼저 온 가이드가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교구 감독 샌루이스’(Saint Louis Bishop)라는 뜻의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다.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딱 중간지점이다. 자동차로는 양쪽 모두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도시는 ‘칼폴리’(Cal Poly)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명문 대학의 캠퍼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그룹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은퇴한 백인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그런지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하다. 차로 다운타운을 지나가다 보니 거리가 꽤 예쁘게 꾸며져 있다. 기차가 연착돼 배가 고픈 일행들은 곧바로 샐러드 식당으로 이동해 배를 채웠다. 식당 옆에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 21’(Forever 21)이 자리하고 있다.
식당가는 길에 ‘마돈나 인’(Mandonna Inn)이라는 모텔이 보였다. 화강석을 주로 사용한 이 모텔은 모든 객실의 디자인 모두 다를 정도로 주인 부부가 설계에 신경을 쓴 곳이다. 투숙객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이유다. 특히 화장실이 특이해 화장실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다. 가수 ‘마돈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 샌시메온
식사가 끝나니 9시가 훌쩍 넘었다. 이제 이 날의 마지막 일정인 샌시메온으로 이동하는 일만 남았다. 101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40분 정도 더 이동했다.
가는 길에 화가들의 도시 ‘캄브리아’(Cambria)가 나왔다. ‘하모니’(Harmony)는 소도시지만 질 좋은 유제품들이 대량 생산돼 예전 허스트캐슬을 방문하던 할리웃 유명 배우들이 꼭 들르던 곳이라 한다. 지금도 유제품들을 미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 연방 우체국이 운영된다. 시장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01번 도로를 4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샌시메온은 숙박의 도시다. 이 도로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곳부터 안개가 자주 끼고 해안 절벽을 따라 도로가 꼬불꼬불해 여행객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베스트웨스턴이나 데이즈인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모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날 아침 맞이한 샌시메온의 아침새벽 공기는 상쾌했다. 모텔 앞 주차장에서 파도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최고급 쇠고기로 분류되는 ‘블랙 앵거스’를 잔뜩 지닌 ‘블랙 카우’들이 초원에서 방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다.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방목되는 블랙 카우들은 도축하기 2~3개월 전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곡류를 먹인다고 한다.
■ 바다코끼리
아침식사는 모텔 옆 조그마한 식당에서 콘티넨탈 브랙퍼스트로 해결한 뒤 샌시메온에서 북쪽으로 5마일 가량 떨어진 허스트캐슬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길에 바다코끼리(Seal Elephant)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잠깐 들렀는데, 8시가 안 된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구경꾼들로 주차장이 가득 차 있다.
물개보다 두 배 정도 큰 몸집을 지니고 있는 바다코끼리는 코가 기다랗다. 코 길이가 성인 팔꿈치 길이 정도 되는데 그리 예뻐 보이지는 않는다. 수놈의 경우 무게가 1.5~1.7톤이라 하니 한우 2마리 정도 된다.
많은 때는 이 곳에서 1만5,00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새끼를 낳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 곁은 떠나지 않는다.
■ 문스톤비치 & 모로락 & 아빌라비치
내려오는 길에 만난 문스톤 비치는 해변의 돌의 모양이 달나라에서 가져 온 운석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곳이다. 별로 넓지 않은 이곳은 듬성듬성 구멍 난 검은색 돌들이 해안가에 잔뜩 깔려 있어 마치 제주도의 용두암 앞바다를 연상시켰다. 문스톤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예쁜 호텔들이 많은데, 가격은 180달러 정도라고 하니 아주 비싼 것도 아니다.
문스톤비치에서 내려오다 보니 모로락이 보였다. 육지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바다 속 한가운데서 불쑥 솟아난 모로락이라는 바위가 있어 이 일대는 전부 ‘모로 베이’(Morro Bay)라고 불린다. 마치 한가로운 한국의 어촌마을을 연상시킨다.
200만년 전 바다에서 용암이 솟아나와 굳어진 게 지금의 모로락이다. 높이는 45피트니 대략 아파트 5층 높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많이 깎여져 나간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바위 주변으로 낚시가 잘 돼 낚싯배들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광고촬영도 많이 이뤄진다고 한다.
아빌라비치 입구에는 호텔, 콘도 타운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시니어타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빌라비치는 아직 개발의 때가 덜 묻은 자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시골스럽고 한국의 어촌마을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이곳에서는 펠리컨을 볼 수 있다. 바다에서는 광어와 게 등이 많이 잡힌다. 피어 한쪽에서는 초고추장에 굴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있어 한국식으로 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 솔뱅
솔뱅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태양의 언덕’이라는 뜻의 솔뱅은 덴마크계 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다. 덴마크계 이민자들은 원래 솔뱅에서 서쪽으로 수십마일 떨어진 ‘롬폭’이라는 곳에 모려 살았지만 현지인들의 텃세를 피하기 위해 솔뱅에 새로 터를 잡았다고 한다.
솔뱅을 마지막으로 여행은 끝이 났다. 1박2일의 길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보고 들른 게 많은 풍성한 여행이었다.
“산 위의 고대유럽 성채”
■허스트캐슬
바다코끼리를 뒤로 한 채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인 허스트캐슬이다.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신문 재벌 랜돌프 허스트가 유럽의 성들을 본 떠 만든 곳이다. 입구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언덕으로 달려야 저택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30여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허스트캐슬은 방이 자그마치 165개다. 산 아래에서 집까지 올라가는 길은 사파리를 연상시키듯 말들과 블랙 카우들이 키워지고 있다. 우리에서는 북극곰과 호랑이도 키웠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테니스장도 2개도 야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따로 하나씩 있고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시설도 갖추고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양식을 따르고 있는 대저택은 분명 아름답지만 덧없는 인간의 욕망이 연상되는 곳이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중가주 명소 순례
바야흐로 봄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코끝을 자극하고 기지개를 켜니 잔뜩 움츠렸던 몸에 활기가 도는 게 느껴진다. 추위를 핑계 삼아 겨울 동안 집에서만 보냈지만 한 번쯤 콧바람을 쐬고 싶어지는 계절.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차여행이다.
최근 한인 여행사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 1박2일 기차여행은 바로 이럴 때 안성맞춤이다. 보통 기차여행의 일행은 약 10명으로, 예전 같으면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시작되지만 올해부터 기차 일정이 변경돼 샌타바바라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기차를 탄다. 예전 일정 같으면 샌타바바라는 기차를 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코스였지만 손님들은 샌타바바라를 볼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인 셈이다. 따뜻한 봄을 맞아 떠나는 1박2일 기차여행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봤다.
미션 관광 후 바닷가 김밥… 관람칸 창너머 절경 펼쳐져
기차여행은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직접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 여유롭고, 창밖의 풍경들을 구경하다 보면 절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 샌타바바라
자동차로 2시간 못 미쳐 달리니 LA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샌타바바라를 알리는 표지가 보였다. 미 서부 대륙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도시여서 샌타바바라는 길 이름은 물론 도시 구조가 스페인 가톨릭 식으로 구성됐다.
샌타바바라의 첫 번째 관광지는 단연 ‘미션’(Mission)이다. 초기 스페인 사람들은 해안을 따라 서부를 탐험하는 중간 중간 미션을 설립했다. 미션은 성당의 기능을 넘어서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고 원주민들에게는 유럽식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한다. 스페인 군인들은 모두 21개의 미션을 설립했는데 샌타바바라 미션은 그 중 10번째다. 샌타이네즈(Santa Ynes) 산맥을 배경으로 산 중턱에 설립된 샌타바바라 미션은 큰 규모 덕분에 ‘미션의 여왕’(Queen of the Mission)으로도 불린단다.
미션 구경을 끝내고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LA서 가져온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백사장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김밥의 맛이 나쁘지 않다. 잘 삶은 계란을 정성들여 싼 봉지에서 소금에 찍어 먹으니 소풍 나온 느낌이 더했다.
■기차 타고 샌루이스 오비스포로
샌루이스 오비스포를 향해 떠나는 기차는 외관부터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국 기차와 달리 2층으로 돼 있어 낭만이 느껴졌다. 구세군 자선냄비 사관 같은 복장을 한 열차 승무원이 티켓 숫자와 사람 숫자를 확인한 뒤 탑승을 허락했다.
1층은 화장실이나 짐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객실은 모두 2층에 있다. 큰 짐들은 모두 1층 수납공간에 두게 되어 있다. 객실에는 좌석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지정 좌석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많아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창가 쪽으로 이동해 않는다. 승무원이 다시 표 검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 더욱 정겨웠다.
좌석 사이의 공간이 꽤 넓지만 등받이는 뒤로 약간만 눕혀져 그리 편하지는 않았다. 기차의 이동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 승차감이 대체로 좋은 편이다.
특히 관람 전용 칸은 말 그래도 차창 밖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 창가 쪽으로는 좌석이 4개씩, 여러 개 배치돼 있어 탁 트인 창으로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관람 차의 절반은 좌석이 마주볼 수 있도록 테이블이 설치돼 있는데 음식을 구입해서 먹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열차 안은 상당히 춥다. 승객들 모두 추워 보이는데도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온다. 여분의 잠바나 가벼운 담요를 지참하는 게 좋을 듯싶다.
샌타바바라는 기차여행의 출발점이다. 기차에 오르기 전 시내를 둘러보는 것도 즐겁다. 한가로운 미션 모습.
바다코끼리·모로락·아빌라항 “구경 한번 잘했네”
■ 기차여행
■ 샌루이스 오비스포
3시간 정도 어둠을 뚫고 밤 8시20분 샌루이스 오비스포 기차역에 도착하자 먼저 온 가이드가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교구 감독 샌루이스’(Saint Louis Bishop)라는 뜻의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다.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딱 중간지점이다. 자동차로는 양쪽 모두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도시는 ‘칼폴리’(Cal Poly)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명문 대학의 캠퍼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그룹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은퇴한 백인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그런지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하다. 차로 다운타운을 지나가다 보니 거리가 꽤 예쁘게 꾸며져 있다. 기차가 연착돼 배가 고픈 일행들은 곧바로 샐러드 식당으로 이동해 배를 채웠다. 식당 옆에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 21’(Forever 21)이 자리하고 있다.
식당가는 길에 ‘마돈나 인’(Mandonna Inn)이라는 모텔이 보였다. 화강석을 주로 사용한 이 모텔은 모든 객실의 디자인 모두 다를 정도로 주인 부부가 설계에 신경을 쓴 곳이다. 투숙객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이유다. 특히 화장실이 특이해 화장실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다. 가수 ‘마돈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 샌시메온
식사가 끝나니 9시가 훌쩍 넘었다. 이제 이 날의 마지막 일정인 샌시메온으로 이동하는 일만 남았다. 101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40분 정도 더 이동했다.
가는 길에 화가들의 도시 ‘캄브리아’(Cambria)가 나왔다. ‘하모니’(Harmony)는 소도시지만 질 좋은 유제품들이 대량 생산돼 예전 허스트캐슬을 방문하던 할리웃 유명 배우들이 꼭 들르던 곳이라 한다. 지금도 유제품들을 미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 연방 우체국이 운영된다. 시장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01번 도로를 4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샌시메온은 숙박의 도시다. 이 도로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곳부터 안개가 자주 끼고 해안 절벽을 따라 도로가 꼬불꼬불해 여행객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베스트웨스턴이나 데이즈인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모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날 아침 맞이한 샌시메온의 아침새벽 공기는 상쾌했다. 모텔 앞 주차장에서 파도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최고급 쇠고기로 분류되는 ‘블랙 앵거스’를 잔뜩 지닌 ‘블랙 카우’들이 초원에서 방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다.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방목되는 블랙 카우들은 도축하기 2~3개월 전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곡류를 먹인다고 한다.
■ 바다코끼리
아침식사는 모텔 옆 조그마한 식당에서 콘티넨탈 브랙퍼스트로 해결한 뒤 샌시메온에서 북쪽으로 5마일 가량 떨어진 허스트캐슬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길에 바다코끼리(Seal Elephant)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잠깐 들렀는데, 8시가 안 된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구경꾼들로 주차장이 가득 차 있다.
물개보다 두 배 정도 큰 몸집을 지니고 있는 바다코끼리는 코가 기다랗다. 코 길이가 성인 팔꿈치 길이 정도 되는데 그리 예뻐 보이지는 않는다. 수놈의 경우 무게가 1.5~1.7톤이라 하니 한우 2마리 정도 된다.
많은 때는 이 곳에서 1만5,00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새끼를 낳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 곁은 떠나지 않는다.
■ 문스톤비치 & 모로락 & 아빌라비치
내려오는 길에 만난 문스톤 비치는 해변의 돌의 모양이 달나라에서 가져 온 운석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곳이다. 별로 넓지 않은 이곳은 듬성듬성 구멍 난 검은색 돌들이 해안가에 잔뜩 깔려 있어 마치 제주도의 용두암 앞바다를 연상시켰다. 문스톤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예쁜 호텔들이 많은데, 가격은 180달러 정도라고 하니 아주 비싼 것도 아니다.
문스톤비치에서 내려오다 보니 모로락이 보였다. 육지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바다 속 한가운데서 불쑥 솟아난 모로락이라는 바위가 있어 이 일대는 전부 ‘모로 베이’(Morro Bay)라고 불린다. 마치 한가로운 한국의 어촌마을을 연상시킨다.
200만년 전 바다에서 용암이 솟아나와 굳어진 게 지금의 모로락이다. 높이는 45피트니 대략 아파트 5층 높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많이 깎여져 나간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바위 주변으로 낚시가 잘 돼 낚싯배들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광고촬영도 많이 이뤄진다고 한다.
아빌라비치 입구에는 호텔, 콘도 타운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시니어타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빌라비치는 아직 개발의 때가 덜 묻은 자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시골스럽고 한국의 어촌마을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이곳에서는 펠리컨을 볼 수 있다. 바다에서는 광어와 게 등이 많이 잡힌다. 피어 한쪽에서는 초고추장에 굴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있어 한국식으로 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 솔뱅
솔뱅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태양의 언덕’이라는 뜻의 솔뱅은 덴마크계 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다. 덴마크계 이민자들은 원래 솔뱅에서 서쪽으로 수십마일 떨어진 ‘롬폭’이라는 곳에 모려 살았지만 현지인들의 텃세를 피하기 위해 솔뱅에 새로 터를 잡았다고 한다.
솔뱅을 마지막으로 여행은 끝이 났다. 1박2일의 길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보고 들른 게 많은 풍성한 여행이었다.
“산 위의 고대유럽 성채”
■허스트캐슬
바다코끼리를 뒤로 한 채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인 허스트캐슬이다.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신문 재벌 랜돌프 허스트가 유럽의 성들을 본 떠 만든 곳이다. 입구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언덕으로 달려야 저택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30여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허스트캐슬은 방이 자그마치 165개다. 산 아래에서 집까지 올라가는 길은 사파리를 연상시키듯 말들과 블랙 카우들이 키워지고 있다. 우리에서는 북극곰과 호랑이도 키웠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테니스장도 2개도 야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따로 하나씩 있고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시설도 갖추고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양식을 따르고 있는 대저택은 분명 아름답지만 덧없는 인간의 욕망이 연상되는 곳이다.